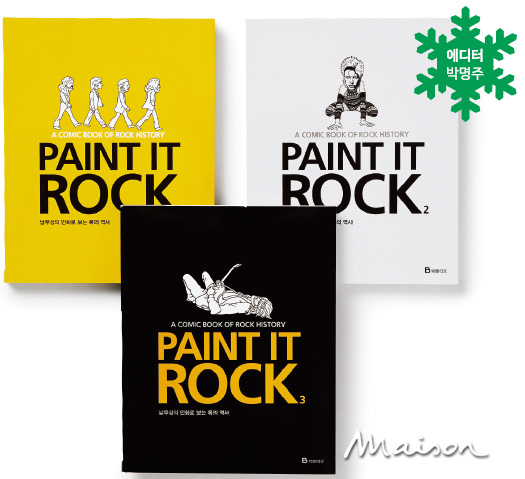시간과 노력으로 물건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의 이야기.
이번 달은 열여섯 번째 이야기로 나주 샛골에서 무명을 짜는 노진남 장인을 소개한다.

↑ 목화솜을 타서 뽑아낸 실.
‘뒤 터에는 목화 심어 송이송이 따 벌 적에 좋은 송이 따로 모아 부모 옷에 많이 두고 서리맞이 마고 따서 우리 옷에 놓아 입자’. 예부터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하얗게 벌어진 목화 열매를 따면서 부르던 민요에는 부모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목화의 감촉이 그대로 담겨 있다. 목화는 고려 말 문익점이 중국에서 붓 뚜껑에 몰래 감추고 들여온 것으로 유명하다. 목화를 원료로 한 무명을 입은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으로 불렸으며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류층은 명주나 모피를, 서민들은 삼베를 입었다. 무명 옷감은 튼튼하고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애용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삼베 대신 무명이 화폐 가치를 지니면서 급속히 보급되었다. 근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이 방직이라면 그 출발은 목화였다. 목화의 본고장은 기후가 온화한 전라도 지방에서도 나주의 샛골나이가 대표적인 곳이다.

↑ 전통 방식으로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과정.
‘샛골’은 동당리 마을을 가리키며 ‘나이’는 길쌈을 뜻한다. 지방에 따라 삼베와 모시를 재래 방법으로 짜기도 하지만 요즘 무명을 짜는 곳은 거의 없다. 나주 샛골에서도 베틀이 남아 있는 곳은 김만애 할머니의 집이 유일했다.
1990년, 보유자 인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당시 김만애 할머니의 며느리이자 보유자 후보였던 노진남 장인(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이 시어머니와 함께 같은 번호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노진남 장인은 함평에서 태어나 시집 오기 전까지 머슴을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집에서 살았다.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혼기가 꽉 찬 20세가 되던 해 2월,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오게 되었다는 노진남 장인. 친정에서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본격적으로 무명을 짜기 시작한 것은 시집을 오면서부터였다.

↑ 전통 방식으로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과정.
목화는 오래전부터 귀한 존재였다. 농촌에서 목화를 많이 심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전, 제일 먼저 준비하는 혼수품이 목화솜을 넣은 누비 이불이었다. 그래서 딸이 많은 집은 목화를 더 심었고 어머니들은 직접 이부자리도 만들고 사돈의 옷감을 만들기도 했다.

↑ 솜털처럼 보송한 목화솜.
무명의 제작 과정은 재배와 수확, 씨앗기와 솜타기, 고치말기, 실잣기, 무명날기, 베매기, 무명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목화솜을 타서 실을 뽑고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는 모두 기계화되었지만 노진남 장인은 자신의 숭고한 작업을 끝까지 보존할 것이라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 노진남 장인의 모습.
지금은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에 출품하기 위한 무명을 2필 정도 제작한다. “아 글씨 뭐 있어. 전통을 잇기 위해 일허제, 우리 며느리도 4대째 시방 혀요” 정겹게 웃으시는 미소가 솜사탕처럼 달달했다.
글과 사진 이정민(물나무 스튜디오) | 에디터 박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