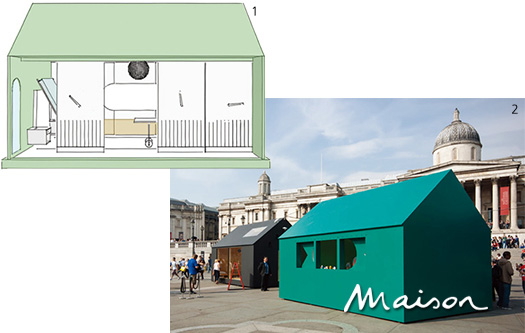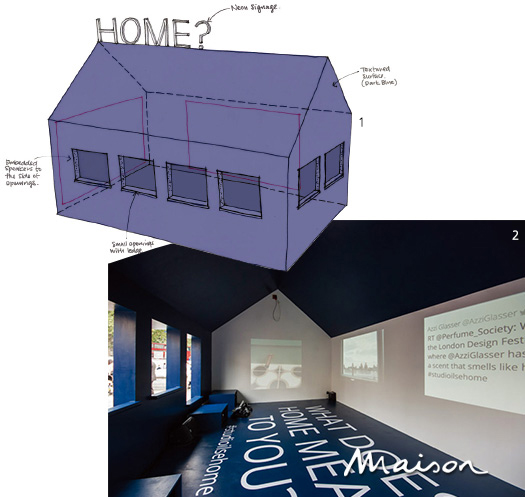독일 특유의 고집과 완고함이 탄생시킨 건 비단 세계적인 명차만이 아니다.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에서는 중세시대 맥주
순수령에서도 비밀스레 지켜온 밀 맥주, 장인 정신으로 만든 수제 소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으로 떠난 맛 기행을 소개한다.

“아우프 디 게준트하이트 Auf die gesundheit!” 구식 독일어 건배사가 거친 회벽으로 둘러싸인 둥근 천장 아래의 공간을 채우고, 음식을 나르는 중세풍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덩달아 연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손길도 바빠진다. 젖먹이 아이처럼 턱받이를 한 사람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고기를 잘라 맨손으로 먹는다. 이곳은 독일 바이에른 주 아우크스부르크의 벨저 쿠헤 Welser Kuche. ‘벨저가 家의 부엌’이라는 뜻을 지닌, 중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레스토랑이다. 한때 남미에 개인 식민지까지 경영했던 유력 가문인 벨저가의 연회에 쓰이던 전통 레시피를 재현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중세의 바이에른 사람들의 테이블 매너까지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자분들은 음식이 떨어져도 잔이 비어도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계신 여자분들이 모든 시중을 들어주셔야 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이 규칙을 어기면 여기 있는 중세 형틀에 들어가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세의 하인 복장을 한 매니저의 유쾌한 설명이 이어진다. 서빙되는 음식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기 돼지 통구이, 각종 허브로 속을 채운 거위 요리, 약한 불에 천천히 익혀 육즙이 함빡 배어 있는 송아지 정강이 요리 등 500년 전 유럽의 최고 부자들이 즐기던 호방한 요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호사스런 식도락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바이에른뿐만 아니라 독일 전 지역은 슈파겔 Spargel, 즉 흰 아스파라거스 열풍에 휩싸인다. 시장의 가판대며 레스토랑 메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슈파겔 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다. 얼핏 보면 양초처럼 보이는 이 밍밍하고 심심한 맛의 채소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열광은 우리가 복날 삼계탕에 대해 가지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슈파겔을 요리하는 법은 무척이나 간단하다. 끓는 물에 껍질을 벗긴 슈파겔을 넣고 푹 삶은 다음 달걀노른자와 식초, 버터와 레몬즙을 넣어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를 끼얹으면 끝이다. 이 소박하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독일 농부들이 느꼈을 안도감과 즐거움을 상상하다 보면, 의외로 밍밍하게만 느껴지던 요리에서 우묵한 단맛과 함께 행복감이 밀려든다 .

사실 독일은 300개가 넘는 군소 국가들로 분열되어 통용되는 돈의 종류만 해도 6000종류에 달할 만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었다. 서민들의 밥상 사정이 넉넉할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1834년 독일어를 쓰는 국가끼리 관세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거듭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지역의 살림살이는 주름을 펴기 시작했고 통일된 국가를 향해 착실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바이에른은 소시지의 천국이다.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다양한 소시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2가지를 꼽으라면 뉘른베르크의 브랏부어스트 Bratwurst와 뮌헨의 바이스부어스트 Weißwurst다. 브랏부어스트는 목재를 때는 화덕에 직화로 구워 먹는 맛이 일품이다. 거칠게 다진 돼지고기에 각종 허브를 섞어 양의 창자에 채워 만든다. 때문에 입에 넣고 씹었을 때, 육즙이 툭 터져나오며 고기 알갱이가 씹히는 맛이 매력 포인트다. 우리의 김치에 해당하는 시큼한 양배추 요리 사우어크라우트 Sauerkraut와 맥주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흰색 소시지인 바이스부어스트는 송아지고기를 곱게 갈아 돼지 창자에 넣어서 만든다. 돼지 창자는 양 창자에 비해 얇기 때문에 불에 구우면 터져버린다. 이런 이유로 바이스부어스트는 끓는 물에 삶아 조리하는데, 담백하고 차진 맛이 그만이다. 여기에 바이에른의 특산물 바이스비어 Weißbier(백맥주로 뿌연 빛이 감돌며 신맛과 단맛 등 일반 맥주에 비해 복잡한 향과 맛을 내는 것이 특징)를 함께 즐긴다면 그 순간만큼은 바이에른의 공작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밀이 주원료인 바이스비어는 보리, 홉, 물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4세의 맥주순수령(1516)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맥주이기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작 가문 내에서만 비밀스럽게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사람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자 역시 가난했던 시절의 역사를 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감자를 먹는 대표적인 방법은 삶은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새콤한 와인 비네거 소스에 버무려 샐러드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을 카르토펠 잘라트 Kartoffel salat라고 하는데, 특히 브랏부어스트와 찰떡궁합이다. 삶은 감자를 으깨서 버터와 육두구를 넣고 경단처럼 빚은 뒤, 끓는 물에 데친 것을 카르토펠 크뇌델 Kartoffel knödel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고기 요리에 가니시로 곁들여 먹기도 한다. 경단을 의미하는 크뇌델은 감자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빵을 활용해 만드는 젬멜 크뇌델 Semmel knödel은 바이에른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다. 오래 놔둬 딱딱해진 빵을 버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점에서 스위스의 퐁듀와도 통한다. 잘게 조각낸 빵에 우유, 달걀, 파슬리, 양파 등을 혼합해 둥글게 빚어 삶는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외양이 좀 큰 타코야키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젬멜 크뇌델은 그 빛깔과 모습 자체로 식욕을 불러일으킨다.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빵이야말로 독일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밀뿐만 아니라 호밀, 보리, 옥수수, 쌀, 기장 등 다양한 곡물로 만드는 독일 빵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빵의 종류만 해도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 문자 그대로 ‘빵의 나라’라는 별명이 이처럼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일수록, 비범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그 이면엔 피나는 노력과 장인 정신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로텐부르크는 중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눈송이를 닮은 과자, 슈니발렌 Schneeballen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중세 시대의 각종 형벌 도구를 전시해놓은 중세범죄박물관이 있다. 주정뱅이를 가두고 망신 주던 술통부터, 솜씨 없는 악사의 손가락을 묶어놓고 벌 주던 피리 모양의 형틀까지 총 3000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앞뜰에 전시해놓은 지렛대 끝에 매달린 새장이다. 말이 새장이지, 사람 하나가 너끈히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다. “이 도구의 이름은 ‘제빵사의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올라프 브뤼거만의 설명이다. “제빵사가 빵의 무게를 속여 팔거나 하면 이 장치에 넣어서 물에 담그는 벌을 주었죠. 간혹 물보다 더 더러운 액체에 담그기도 했다고 해요. 이 형벌은 제빵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맥주 양조업자를 비롯한 모든 장인들에게 해당되었어요.” 가난함 속의 비범함을 발전시켰던 것은 결국, 바이에른 사람들의 고집과 완고함이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빵을 만들 때나 자동차를 만들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양이다. 바이에른 모터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 참, 그 회사의 머릿글자를 따면 BMW라고 하던가.
글 탁재형(다큐멘터리 PD) | 에디터 이경현 | 일러스트레이터 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