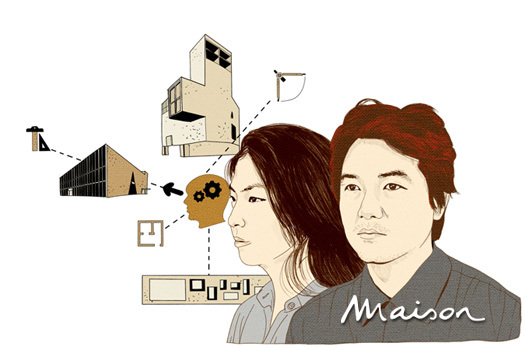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서 도전해볼 만한 테이블 센터피스와 최근 유행하는 간결한 리스를 만들었다. 취향에 맞게 꽃의 종류와 방식을 응용해서 연말 집 안 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들어보자.

↑ 재료 오아시스, 모네 로즈, 실국화, 가스펠 로즈, 심비디움, 반다, 솔방울, 비즈 장식, 초
초이문 최문정 대표
고전 명화 같은 클래식 센터피스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붉은 리본과 꽃을 사용한 센터피스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충실한 센터피스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캐럴을 들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집으로 초대한 날의 저녁 식탁을 떠올리며 금색을 많이 사용해 서양의 고전 명화와 같은 클래식한 느낌의 센터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네 로즈와 가느다란 실국화, 가스펠 로즈, 심비디움, 반다 등 붉은 계열의 꽃을 꽂아 화려하게 연출했고 집에 있는 앤티크 쟁반을 센터피스 받침대로 사용해 정면에서 보면 센터피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액자 속 정물화 같은 느낌입니다. 센터피스를 만들 때는 앞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높이로 꽃을 꽂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방에서 사용하는 컵, 트리에 장식하는 비즈나 금색으로 칠한 솔방울 등을 곁들이면 한층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 장식을 와인잔에 넣거나 센터피스 주변으로 흩뿌리면 반짝이는 효과 때문에 센터피스가 더욱 화려하게 돋보인답니다.”

↑ 재료 곱수버들, 목화 열매, 다육식물, 찔레 열매, 스키미아, 로즈마리, 수염 틸란시아
콤마 정희연 대표
평온함을 주는 내추럴 리스
“최근 유행하는 북유럽 열풍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장식도 간결하고 자연적인 녹색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리스의는 기본 틀인 고수버들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에어 플랜트로 만든 리스는 풍성한 잎과 꽃으로 만든 리스와는 다른 소박하고 평온한 매력이 있습니다. 문에 걸어두거나 끈을 연결에 창가에 매달면 경건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죠.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뻗은 고수버들의 가지를 그대로 살려 원형 틀로 제작하고 솜이 열리기 전의 목화 열매와 다육식물, 찔레 열매, 스키미아, 로즈마리 등을 섞어서 새로운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종종 다육식물과 절화한 꽃을 섞어서 연출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다육식물을 어레인지먼트에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아서 색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수버들로 리스 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꽃시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리스 틀을 구입하면 초보자도 쉽게 장식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