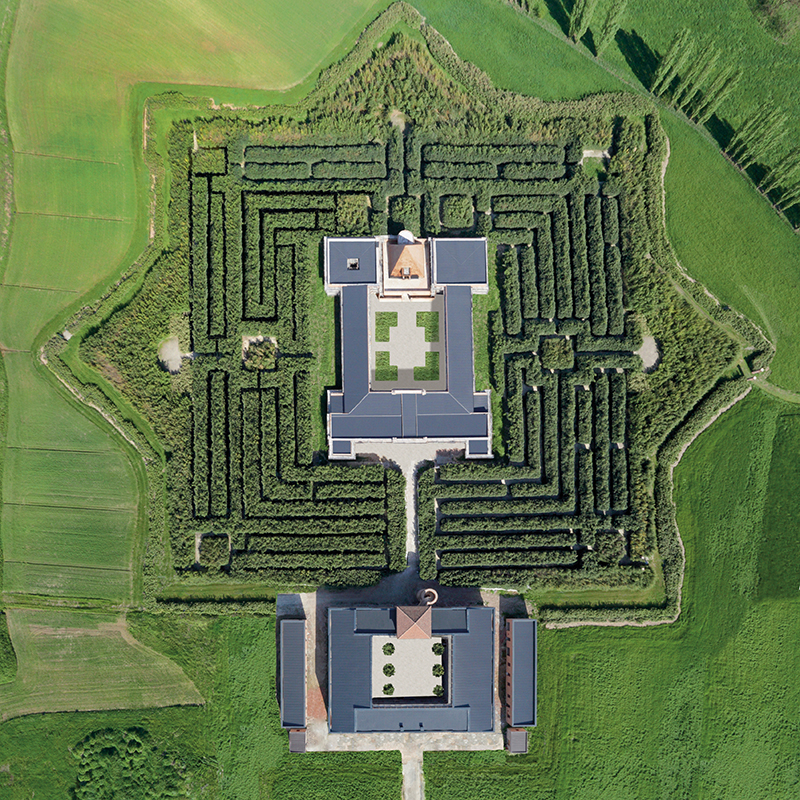17년간 스스로를 클라이언트 삼아 완성해온 집.
직선과 곡선, 그리고 취향과 리듬이 빚어낸 디자인서다 홍희수 대표의 공간.

공간감을 위해 과감히 소파를 없앤 거실. 그 대신 유기적 곡선이 특징인 마르셀 브로이어의 체어를 배치했다.

디자인서다의 홍희수 대표. 천장의 루이스폴센 조명 뒤엔 비비아의 스파 실링 조명이 언뜻 보인다.

직접 만든 사이드 테이블 위에 자개장의 손잡이를 올려 데코했다.

바우하우스에서 영감 받은 그리드와 컬러로 완성한 아들 방

집 안 곳곳에 배치된 10×10 사각 타일과 수직적 리듬을 강조한 인트는 홍 대표가 추구하는 집의 테마를 보여준다.

아들 방 한쪽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인형이 여전히 자리해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여 년 동안 서초동의 오래된 아파트를 개조해 살고 있는 디자인서다의 홍희수 대표. 인테리어 디자이너 겸 스타일리스트로서 여러 고객의 의뢰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온 그는 이 집에서 스스로를 클라이언트 삼아 크고 작은 리노베이션을 거쳐왔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노후한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여기에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사안까지 겹치자 홍 대표는 과감하게 천장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디자인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높아진 층고에는 한국에 아직 수입되지 않은 비비아의 스파 Spa 실링 조명을 찾아 배치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연출해냈다. 그의 집은 수많은 디테일과 운율로 가득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주방에는 직선형 선반이 원형의 굴곡을 갖춘 주방의 후드와 조화를 이룬다. 보통 집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한 후드가 이 집에서는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아르데코와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디자인을 좋아하는 홍 대표의 취향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현관 옆 수납장의 손잡이에서도 원의 형태에 변주를 준 손잡이가 우리를 맞이해준다. “최대한 단순화시킨 공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평소엔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작업해왔다면, 이 집에선 바닥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손잡이가 편하느냐 불편하느냐 등의 요소를 따지지 않아도 됐거든요.

루이스폴센 조명과 프리츠한센 테이블로 꾸며진 다이닝 공간. 뒤쪽 수납장의 손잡이 또한 집 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각형의 셰입을 갖췄다.

원 형태에서 변주를 준 현관 수납장 손잡이.

닫힌 공간인 줄 알았던 수납장 끝의 문을 열면 공간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거실까지 연결된 주방 작업대는 거실에선 책상 역할도 한다. 스피커는 트랜스페어런트 제품.

모더니즘의 정수를 담아낸 기하학적 절제미가 돋보이는 공간. 이현준 사진가의 작품과 빈티지 의자로 장식했다.

빛과 구조, 재료의 조합이 돋보이는 화장실. 수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얇은 벽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
오롯이 제가 주체가 된 거죠.” 포개지거나 일렬로 나란히 병치된 정사각형 타일과 손잡이, 여러 테마로 나타나는 원의 형태와 직선, 곡선의 형태를 띤 가구들이 끊기듯 이어지듯 반복되며 하나의 리듬을 이룬다. 지난해 리노베이션을 마친 주방 공간 또한 마찬가지다. “집이 워낙 길다 보니, 거실과 주방이 끊어지는 흐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작업대를 거실까지 연결되게끔 만들었죠.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는 순간 데드 스페이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확장된 주방의 작업대는 거실에서는 책상 역할을 한다. 공간 흐름을 위해 거실의 소파 또한 덜어냈다. “소파를 배치하는 순간, 이 틀이 깨져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멋있는 가구들을 애써 채워놓기보다는, 디테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대신 톰 딕슨의 체어, 프리츠 한센의 테이블부터 직접 디자인한 사이드 테이블과 곳곳에 배치된 빈티지 가구들이 선적인 운율을 더했다. 거실의 장과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침실의 협탁은 모두 열고 닫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해 구성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홍 대표의 말처럼 크지 않은 집이지만,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자리한 덕에 집의 짜임새를 를 띤 가구들이 끊기듯 이어지듯 반복되며 하나의 리듬을 이룬다. 지난해 리노베이션을 마친 주방 공간 또한 마찬가지다. “집이 워낙 길다 보니, 거실과 주방이 끊어지는 흐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작업대를 거실까지 연결되게끔 만들었죠.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는 순간 데드 스페이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확장된 주방의 작업대는 거실에서는 책상 역할을 한다. 공간 흐름을 위해 거실의 소파 또한 덜어냈다. “소파를 배치하는 순간, 이 틀이 깨져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멋있는 가구들을 애써 채워놓기보다는, 디테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대신 톰 딕슨의 체어, 프리츠 한센의 테이블부터 직접 디자인한 사이드 테이블과 곳곳에 배치된 빈티지 가구들이 선적인 운율을 더했다. 거실의 장과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침실의 협탁은 모두 열고 닫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해 구성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홍 대표의 말처럼 크지 않은 집이지만,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자리한 덕에 집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데 불필요한 오브제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홍 대표에게 집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자 안식처다. “집에 있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식처라는 게 결국 그곳에 익숙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스토리가 담긴 물건들이 나만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고, 그것이 곧 안식처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새로 사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해외로 유학을 간 아들 방에는 여전히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인형과 피규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별한 일과를 소화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봐도 편안한 공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쌓아올린 그의 집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취향, 그리고 감각 자체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나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한 선택과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는 디테일들. 홍희수 대표에게 집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일상 속 가장 진실한 표현인 셈이다.


문밖에서 바라본 침실 풍경. 원형 거울과 곡선형 선반, 의자의 유려한 라인이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낸다.

홍 대표가 직접 만든 헤드보드. 상단의 두 줄 프레임이 시각적 중심을 잡아주며, 패턴과 소재를 차분하게 정돈한다.